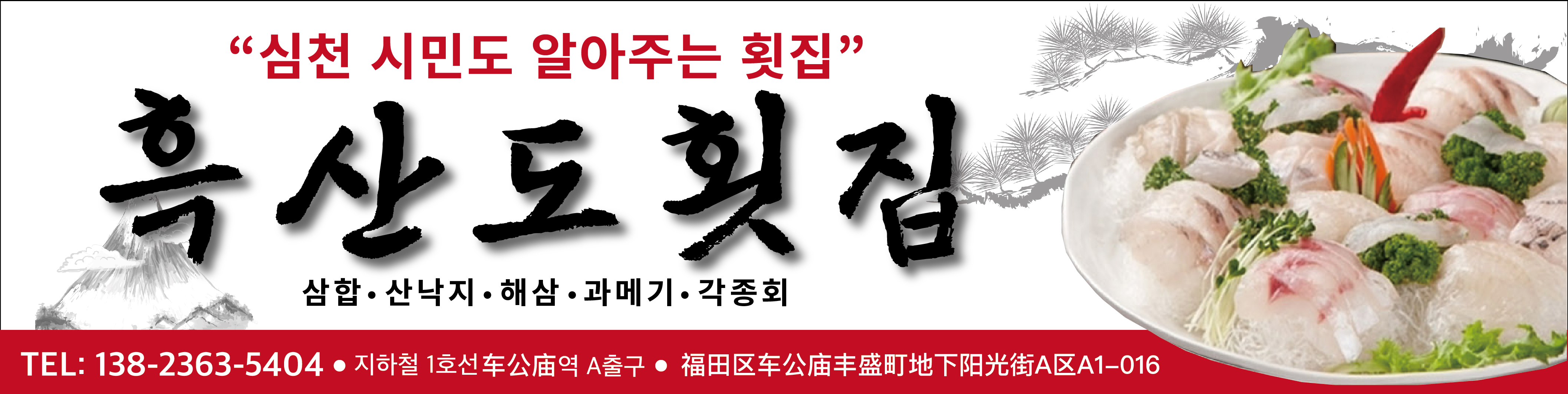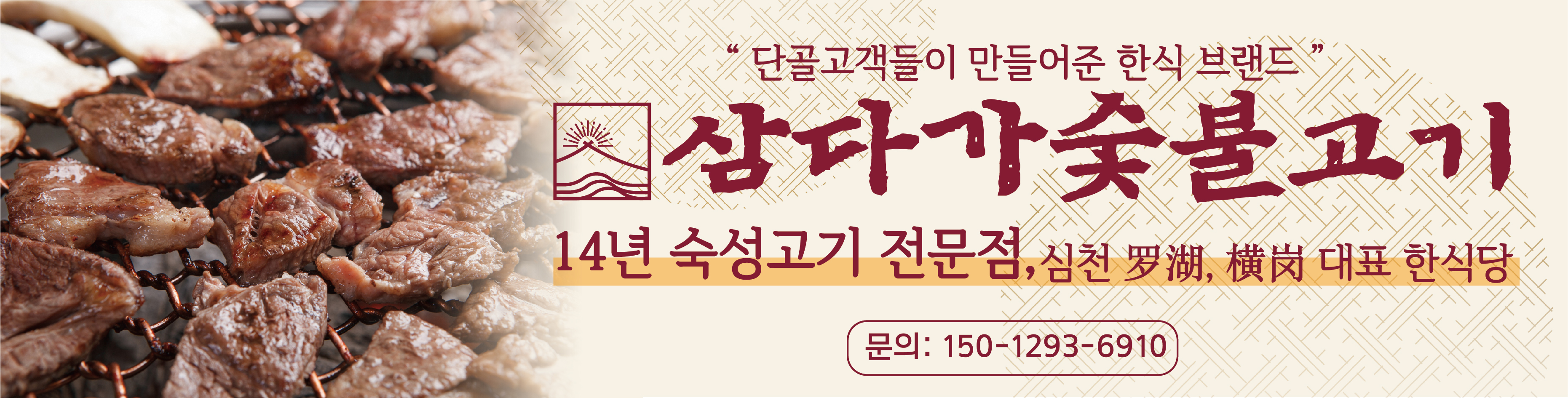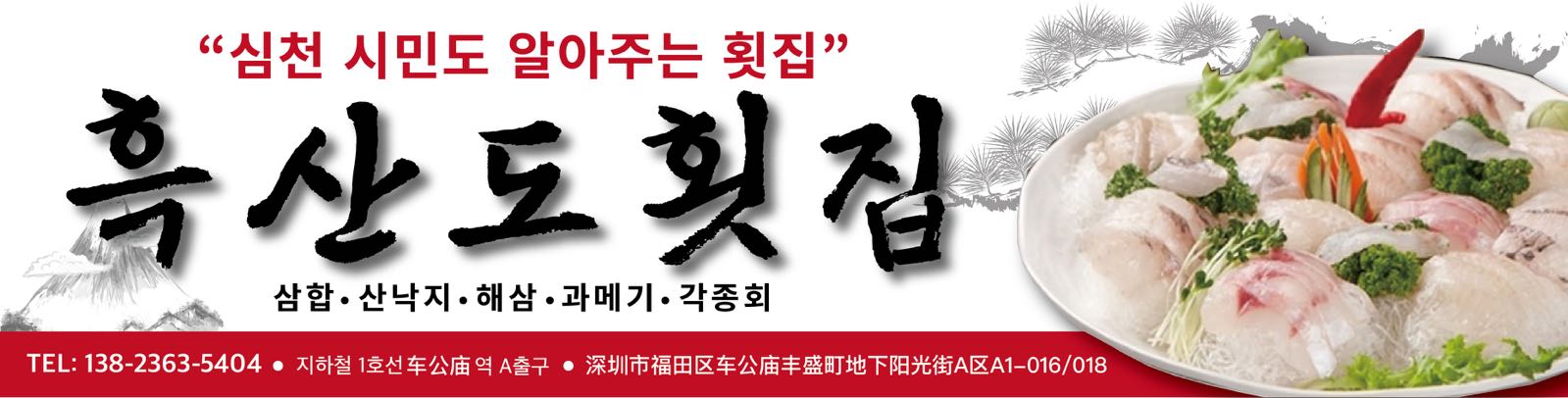황푸군관학교 기념관에 소개된 양림을 소개합니다.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항푸군교의 교관이 될 수 있는데 양림은 어떤 분이기에 황푸군관학교 외국인 직업 교관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다.
양림의 본명은 김훈(金勳)입니다. 춘식, 양림(楊林), 양주평(楊州平), 양녕(杨宁), 비스티(弼士第 毕士悌 등이 모두 김훈 한 사람의 가명입니다. 활동지를 바꾸면 이름도 변경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썼을까요? 자신이 일제에 노출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훈은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다가 삼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부친과 만세운동에 참가했습니다. 부친이 일본 경찰에 잡혀 죽었습니다. 의분을 참지 못한 김훈은 반일 단체에 가담해서 항일운동을 했는데 지명 수배자가 되었네요. 평양에 머무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반일 운동을 하다가 만난 여자친구 이추악(李秋岳, 1901~1936)에게 평양에서 항일운동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을 찾아오라는 메모를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김훈이 중국에 와서 찾아간 곳은 지린(吉林) 통화현(通化縣) 허니허(哈泥河)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 호족 이항복(李恒福, 1556-1918) 후손 이회영(李會榮, 1867~1932) 일가가 설립한 군사학교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이회영 일가 6형제(健榮, 石榮, 哲榮, 會榮, 始榮, 護榮) 는 가진 모든 가산을 처분해 4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회영 일가족 40여 명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에 압록강을 건너 지린 류허현(柳河县) 산웬푸(三源浦) 쩌자가(邹家街)로 이주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일제에 빼앗겼지만, 군사를 배양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군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함부로 군사학교는 세울 수 없지요. 그래서 쩌자가 마을 한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 학교를 개교하고 중국당국과 일제의 의혹을 피하고자 무관학교라는 명칭 대신 신흥강습소라고 학교명을 지었습니다. 그 때가1911년 5월 14일(양력6월22일)입니다.
만주에 한인 군사학교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학생들이 찾아 왔습니다. 삼일만세운동 이후에는 학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선을 탈출해 나오는 청년들, 재만 동포, 과거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노년층, 십 칠팔 세 소년부터 오십 대 노년까지 약 60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교사가 부족해 류허현(柳河縣) 구산즈(孤山子) 허동(河洞) 언덕에 숙사 40여 칸을 짓고 수만 평의 연병장을 마련하여 몰려오는 애국청년들을 수용했습니다. 2년제 고등군사반에서는 고급 간부를 양성하고 퉁화현 치다오거우(七道溝)와 콰이다마오즈(快大茂子) 분교에서는 3개월 과정과 6개월 과정으로 속성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체조와 구보를 시작으로 밤 9시까지 수업과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목총으로 총기를 대신하고, 일본 병서와 중국 병서를 번역하여 등사판으로 밀어 만든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야외에서 이 고지 저 고지로 옮겨 다니며 가상공격과 방어전을 치르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도강, 상륙작전을 하면서 전술학을 배우고 빙상, 축구, 철봉뿐 아니라 엄동설한 야간에 70리 강행군도 체육수업입니다.
신흥무관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삼일운동에 참가했다가 일제 추적을 피해 나온 자들이어서 혁명정신이 충만하기도 했지만, 신흥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같은 훌륭한 분들에게서 감화받아 고된 훈련을 잘 감내했습니다. 급식은 중국인이 밭에 버린 언 무를 주워 소금에 끓여 국을 만들고 좁쌀밥은 동물 사료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엄격한 학교규율을 지켜며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김훈은 백두산을 향해 ‘구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면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글: 한국독립운동역사연구회 강정애
저작권자 © (칸칸차이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5 칸칸차이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