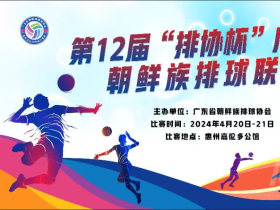기사상세페이지
1927년 4월, ‘청당(淸黨)’정변으로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국민당이 공산당원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김훈부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김훈은 삐스티(毕士悌)로 개명하고 모스크바 중산대에서 1년간 정치이론을 공부하고 모스크바 육군보병학교로 옮겨 다시1년간 군사학을 공부했습니다.
1930년 봄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를 향해 무장투쟁을 인솔할 수 있는 조선족 군사간부 한 명을 동만주지역으로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김훈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동만주특별위원 겸 군사위원서기로 파견되었습니다.
1926년 5월, 헤이룽장 하얼빈 주허현(珠河縣)에서 성립된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주지역을 동만(東滿), 남만(南滿), 북만(北滿)으로 분류해서 관할했습니다. 둥만은 옌지(延吉), 훈춘(琿春), 허룽(和龍), 왕칭(汪淸), 둔화(敦化), 안투(安圖), 창바이(長白) 등 이며, 남만은 지린(吉林), 단둥(丹東) 일대, 하얼빈(哈爾濱) 이북, 중동 철도노선 일대를 칭하며 쑹화(松花)강 하류의 광범위한 지역을 북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무렵 소련이“일국일당”원칙을 발표했는데, 한 나라에 한 개 당 원칙을 지키야 함으로 중국에는 중국공산당 활동만 허용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당은 해산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1928년 8월경 중공동만구위원회 산하 10개 지부 조선공산당원이 탈퇴하여 22명만 남았습니다. 1930년 3월 조선공산당 ML파도 조선공산당만주총국 해체를 선언하고 이어 다른 파벌 공산당도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동북지방에서 조선공산당 조직이 거의 해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해산된 조선공산당원들을 중국공산당으로 결집해야 했습니다.
김훈은 옌지현 무산(茂山)촌에 와서 간부회의를 열고 중국공산당만주당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부인 이추악과 지역을 순회하며 활동한 결과, 1930년 8~10월 사이 옌지, 왕칭, 롱징 등지에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은 모두 670명인데 그 중 전체 98.5%를 차지하는660명이 한인이었습니다. 그 해10월부터 김훈은 이들을 기반으로 동만특별위원회를 조직했는데1931년 2월까지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산하에 6개 현위원회, 19개 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이후, 김훈은 하얼빈 중공동만주성위원회 군사위원회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요임무는 인민대중을 무장시켜 항일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는 무장 대오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지린 판스(盤石)현에 정치군사간부 훈련반을 조직하고 한족과 조선족 군중들을 규합하여 대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좀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1932년 4월, 반일 농민봉기를 일으켜 친일파 50여명을 숙청하고 일제가 건설한 철도를 파괴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판스에는 이동광((1904~1937), 이홍광(1910~1935)이 친일배를 처벌하는‘개잡이부대’가 있었습니다. 김훈은 ‘개잡이부대’를 토대로 청년들을 흡수하여 반석노농의용군이라는 남만유격대를 설립했습니다. 1932년 5월 7일, 하마하자(河马河子)에서 조선족과 한족 800~900여명과 항일무장 시위를 전개하고 나흘동안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친일배 40여명을 처단했습니다.
김훈은 동만주에서 기존의 돌격대, 권총대, 장총대 등 360여명을 모아 동만항일유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김훈의 지휘를 받은 옌지현과 허롱현 일대의 농민들은 공산당과 협력하여 친일주구파와 지주들로부터 소작계약서와 고리대금 문서를 빼앗아 소각하고 식량과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곳곳에 농민협회가 세워지고 농민자위대도 조직되었습니다.
남만에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자 한인들은 1930년 5월27일 자신들만의 활동기지 야오수이동(藥水洞)소비에트를 건립했습니다. 대중기반이 좋고 일제 통치기관과 멀리 떨어진 산간마을 샤오왕칭(小汪清), 다황거우(大荒溝)에 소비에트는 조선인 항일유격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근거지내의 인구는 약 2만여명이며 그 중 90%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지역에서 토지의 주인이 된 농민들은 유격대원과 마치 한 집안 식구처럼 도우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소비에트정부에서 반포한 “소학교의무교육법”에 따라 대중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마련하고 시사정치 및 혁명투쟁 사상과 군사지식도 가르쳤습니다.
항일유격근거지에는 착취제도와 억압이 없는 사회, 인민대중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조성한다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혁명을 실시했습니다. 16세 이상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인 권리도 부여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밑이나 움막을 교실로 삼아 공부를 하며 유격대를 도와 곤봉을 쥐고 보초를 서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근거지내에 농민협회, 반일회, 부녀회 등 대중단체가 적위대, 농민자위대, 청년의용군 등 무장단체들이 항일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깊은 산속에 무기수리소를 마련하여 작탄을 제조하고 부녀들은 의복을 만들어 유격대를 지원했습니다.
김훈은 “추수투쟁”, “춘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1년 9월, 추수때를 기해 옌지현 농민 800여명은 각 농촌마을을 행진하며 “제국주의 타도”와“소작료 인하”등을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지주들로부터 양식을 빌려야 하는 춘궁기에 “양식 탈취” 투쟁을 전개했지요. 1932년 2월, 옌지현 이란구(義蘭區) 일대에서는 농민들이 일본경찰서를 포위하고 식량창고를 탈취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글: 한국독립운동역사연구회 강정애